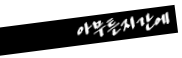어제 아침 잠결에 엄마가 내 머리맡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아마도 "너 번역한 거 번역료 여기 두고 간다" 였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 머리맡의 봉투를 열어 보니 25만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횡재했다는 식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을의 입장인 나로서는 불쾌에 부당함을 거듭하여 결국 떨어진 돈이었다.
원래대로라면 번역 원고를 넘겼던 지난 8월 말에 계산이 끝났어야 할 일이었다. 엉터리 비문이 가득한 인도-스리랑카식 영어를 적당한 우리말로 바꿔 주느라, 그나마도 역자로서의 미학적 자존심은 있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느라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른다. 하루에도 열몇 번씩 원문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러다가도 '에이씨 이것 번역하면 장당 만 원이랬는데' 하며 이 악물고 다시 샤프를 집어들었었다. 그 장당 만 원이란 것마저도 내가 엄마를 중개로 놓고 협상을 요구한 끝에 얻은 결과였지, 내가 엄마 말마따나 "엄마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 건데 걍 공부한다 셈치고" 넙죽 봉사활동을 해줬더라면 장당 오천 원으로 더러운 헐값에 내 노동력을 팔아치웠을 것이다.
사실 난 클라이언트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른다. 말해주질 않는다.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 청탁한 서류도, 무슨 아유르베다 리조트니 정부 DB 클라이언트 구축이니 아주 수상쩍은 사업 내용들뿐이었다. 작업하는 내내 불안하고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도망가면 그만 아닌가?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현장이 매번 이런 식이었던 건 아닐까? 모든 일은 하청의 하청의 부탁의 하청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일에 대한 자존심 하나로 일하는 건지도 모른다. 아주 기분이 더러웠다. 내가 뭣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걸까? 방학이라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은 논점이 아니다.
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가 싫은 적이 없었는데 하여간 어찌어찌 그것도 기일에 맞춰서 타이핑까지 쳐서 엄마 손에 들려 보내줬다. 그랬더니 묵묵부답이다가 어느 날 엄마가 날 조용히 불렀다.
"니 원고료를,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엄마 적금통장에 보내 버려서 빼질 못해, 좀만 기다려 봐"
씨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분명히 납품한 원고에 내 계좌번호를 적어서 줬단 말이다. 값을 얼마 치르면 되는지 그 계산 내역도 적어줬었다. 하도 화가 나서 내가 무례를 무릅쓰고 엄마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가면서 그 사람 연락처 내놓으라고 했는데 엄마도 눈 부릅떠 가며 "나도 할 만큼 했다" 하기에 그만뒀다 뿐이지,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없던 화가 치민다. 학생이면, 애면, 시팔 그 따위로 하대를 해도 되는 거냐?
그래 결국 1월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나 그 요를 받았다.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다는 게 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싶다가, 지갑에 만 2천 원밖에 없던 나에게 25만원, 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더라. 배추잎 25장을 다 빼서 지갑에 통으로 넣고 교보문고로 가서 한 세 시간을 돌아다녔다. '내가 지금은 뭐든지 사려고 하면 살 수 있다. 무려 현찰로.' 그 기분을 즐기다가, 습관대로 '그래도 다음에 사자.' 하는 생각으로 돌이키게 되면서 내 자신이 참 한심했다. 돈을 줘도 못 쓰는 촌놈 같으니. 그래 결국 예전부터 자꾸 눈이 가던 웬 건축 관련 미니북을 하나 샀다. 생각해 보면 책이란 참 터무니없이 싼 것이다. 몇백 페이지에 몇만 원이라 치면, 페이지당 백 원이란 소리 아닌가.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더 받아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왜 그 현찰이란 걸 받는 순간에 싸그리 날아가버리는 것일까? 어제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겠다. 갑을관계란 그런 것이다. 개 같은 자본가들. 돈이 조건 내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가치인 개병신들. 시팔 절대 잊지 말아야지. 내가 다음부턴 어디서 일하든 무조건 서면계약서부터 쓰고 봐야겠다.
아마도 "너 번역한 거 번역료 여기 두고 간다" 였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 머리맡의 봉투를 열어 보니 25만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횡재했다는 식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을의 입장인 나로서는 불쾌에 부당함을 거듭하여 결국 떨어진 돈이었다.
원래대로라면 번역 원고를 넘겼던 지난 8월 말에 계산이 끝났어야 할 일이었다. 엉터리 비문이 가득한 인도-스리랑카식 영어를 적당한 우리말로 바꿔 주느라, 그나마도 역자로서의 미학적 자존심은 있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느라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른다. 하루에도 열몇 번씩 원문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러다가도 '에이씨 이것 번역하면 장당 만 원이랬는데' 하며 이 악물고 다시 샤프를 집어들었었다. 그 장당 만 원이란 것마저도 내가 엄마를 중개로 놓고 협상을 요구한 끝에 얻은 결과였지, 내가 엄마 말마따나 "엄마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 건데 걍 공부한다 셈치고" 넙죽 봉사활동을 해줬더라면 장당 오천 원으로 더러운 헐값에 내 노동력을 팔아치웠을 것이다.
사실 난 클라이언트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른다. 말해주질 않는다.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 청탁한 서류도, 무슨 아유르베다 리조트니 정부 DB 클라이언트 구축이니 아주 수상쩍은 사업 내용들뿐이었다. 작업하는 내내 불안하고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도망가면 그만 아닌가?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현장이 매번 이런 식이었던 건 아닐까? 모든 일은 하청의 하청의 부탁의 하청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일에 대한 자존심 하나로 일하는 건지도 모른다. 아주 기분이 더러웠다. 내가 뭣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걸까? 방학이라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은 논점이 아니다.
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가 싫은 적이 없었는데 하여간 어찌어찌 그것도 기일에 맞춰서 타이핑까지 쳐서 엄마 손에 들려 보내줬다. 그랬더니 묵묵부답이다가 어느 날 엄마가 날 조용히 불렀다.
"니 원고료를,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엄마 적금통장에 보내 버려서 빼질 못해, 좀만 기다려 봐"
씨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분명히 납품한 원고에 내 계좌번호를 적어서 줬단 말이다. 값을 얼마 치르면 되는지 그 계산 내역도 적어줬었다. 하도 화가 나서 내가 무례를 무릅쓰고 엄마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가면서 그 사람 연락처 내놓으라고 했는데 엄마도 눈 부릅떠 가며 "나도 할 만큼 했다" 하기에 그만뒀다 뿐이지,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없던 화가 치민다. 학생이면, 애면, 시팔 그 따위로 하대를 해도 되는 거냐?
그래 결국 1월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나 그 요를 받았다.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다는 게 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싶다가, 지갑에 만 2천 원밖에 없던 나에게 25만원, 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더라. 배추잎 25장을 다 빼서 지갑에 통으로 넣고 교보문고로 가서 한 세 시간을 돌아다녔다. '내가 지금은 뭐든지 사려고 하면 살 수 있다. 무려 현찰로.' 그 기분을 즐기다가, 습관대로 '그래도 다음에 사자.' 하는 생각으로 돌이키게 되면서 내 자신이 참 한심했다. 돈을 줘도 못 쓰는 촌놈 같으니. 그래 결국 예전부터 자꾸 눈이 가던 웬 건축 관련 미니북을 하나 샀다. 생각해 보면 책이란 참 터무니없이 싼 것이다. 몇백 페이지에 몇만 원이라 치면, 페이지당 백 원이란 소리 아닌가.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더 받아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왜 그 현찰이란 걸 받는 순간에 싸그리 날아가버리는 것일까? 어제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겠다. 갑을관계란 그런 것이다. 개 같은 자본가들. 돈이 조건 내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가치인 개병신들. 시팔 절대 잊지 말아야지. 내가 다음부턴 어디서 일하든 무조건 서면계약서부터 쓰고 봐야겠다.
'4 생각을 놓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왜 방송3사의 파업투쟁은 뒷맛이 개운치 않은가 (4) | 2012.03.17 |
|---|---|
| 애니 시청 습관 10문 (0) | 2012.03.04 |
| 정태영 사장 (6) | 2011.10.28 |
| 신촌의 문화생태론 (2) | 2011.10.21 |
| 기자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0) | 2011.08.27 |